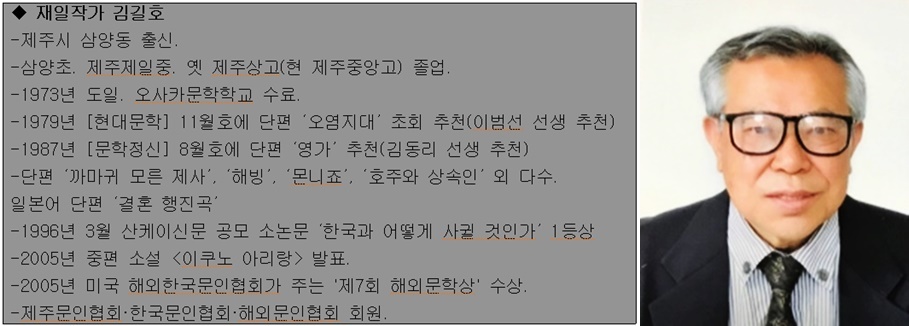40여일이 지나서 제주에서 우송한 우편물이 아장거리며 도착했다. 코로나가 없었을 때는 4, 5일이면 왔던 우편물이다. 그래서 서귀포만이 아니고 제주가 더 그리울 때가 있다. 오승철 시인의 시조집 ‘사람보다 서귀포가 그리울 때가 있다’는 그럴 때 반갑게 찾아왔다.
5부로 나눠진 시조 58편 중에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발췌한 7편을 소개한다.
첫 번쨰 작품은 ‘수지맞다’이다.
수지맞다
개같이 쓰라는 거냐
정승같이 쓰란거냐
퍼주고 흩뿌려도 남아도는 가을 햇살
세상에 왔다는 것이
죄스럽고
고맙다
여름을 알리는 6월 하지의 기나긴 여름 햇살을 놔두고 왜 가을 햇살이 퍼주고 흩뿌려도 남아도는 햇살이라고 했을까. 머리를 갸웃거리게 한다. 마치 그 햇살을 제대로 전부 쓰지 못한 것처럼 죄스럽다고 고백까지 한다.
그런데 가을걷이가 끝난 기름진 옥전옥답의 황량한 모습은 우리의 마음을 애잔하고 슬프게 한다. 솔솔 부는 가을바람의 스산함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애절하게 만든다. 그 인생의 반추를 애써 감추려고 개같이, 정승같이라면서 억지춘향을 부리고 있다.
다음은 ‘축하, 받다’이다.
축하, 받다
어머니 한 세상은 그믐밤 믐빛이었다
<4.3>이며, 녹내장
순명이듯 받아들고
손주놈 군사우편도 못 읽는 믐빛이었다
벚꽃 환한 봄 탓이리
외출도 봄 탓이리
몇 수저의 저녁상
그마저 물려놓고
화급히 성당 저 너머 사라진 숟가락 하나
“잘 갑서, 잘 가십서” 아내의 기도 소리
이 봉투 저 봉투
그중에 어느 봉투
‘장모님 하늘나라 입학, 삼가 축하합니다’
그믐밤 ‘믐빛’은 어떤 빛일까. 신선한 발상에 솔직히 읽으면서 소름이 끼쳤다. 사랑하는 손주의 정성이 구구절절 들어 있는 군사우편도 못 읽는 믐빛이란다. 그것은 <4.3>과 녹내장이 겹치는 험난한 인생의 고비고비를 살아온 어머니의 순명같은 삶이라고 한다.
‘화급히 성당 저 너머 사라진 숟가락 하나’로 생을 마감한 장모를 ‘잘 갑서 잘 가십서’ 아내의 기도 앞에는 여러 봉투가 놓여있다.
이 봉투 저 봉투 그 중에 어느 봉투 ‘장모님 하늘나라 입학, 삼가 축하합니다’ 사위의 해학적인 풍자가 장모의 믐빛 인생을 대변하고 있다.
다음은 '합제'이다.
합제 合祭
큰형네 종교 따라 추도예배 드리는 저녁
홍동백서 그 대신에 성경 한 권뿐이네
절 한번 올리지 못한 둘째 형의 저 묵언
아내는 아내대로 남몰래 성호 긋고
큰아버진 절집에서 어떤 예불 올릴까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창틀에 핀 초승달
한국인의 영원한 테마인 장례문화의 심리적 갈등의 한 풍경이다. 모든 것을 품어 줄 것 같은 대보름달이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다.
자신도 불안한 초승달이 창틀에서 부조리의 장례의례를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닐까.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몇 년전, 필자의 어머니 장례식 풍경과 오버랩되고 있다.
다음은 ‘울럿이’다.
울럿이
누게 오렌 헤시카
누게 가렌 헤시카
고향은 고향대로
입 비쭉 코 비쭉 ᄒᆞ는디
울럿이 정제 무뚱을 감장 도는 ᄌᆞ냑 ᄉᆞ시
이현령비현령(耳縣鈴鼻縣鈴)이라는 말이 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의미이다.
오승철 시인의 특이한 연출로 투박한 제주사투리도 언어의 리듬에 맞춰서 음악의 멜로디처럼 매끈하게 넘어간다. 아니 시라기보다 하나의 음악이다. ‘울럿이 멍한 한 순간’이 어떻게 시가 될 수 있을까.
그러나 오승철 시인은 자신 갖고 그것을 시라고 내놓는다. 언제나 오 시인의 작품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그가 구사하는 시어(詩語)는 따로 없다. ‘울럿이’는 통쾌하게 그것을 입증하고 있다.
제주어의 진수(珍秀)이다.

간출여
섬도 항거하면 위리안치 당하는가
내가 사는 제주섬도
200년 동안이나
탱자꽃 가시울 대신 수평선이 닫혔었다
이름하여 ‘출륙금지령’
내 어머니 태왁마저
들물 날물 바다에 실려 갔다 오는 건
물마루 저 건너 땅에 숨비소리 건넨 거다
썰물 때만 나오는 간출여랴 가출여랴
휴대폰도 인터넷도 소용없는 이 그리움
아직도 닐모리동동
서성이는 사람이 있다
제주섬의 위리안치는 사방의 수평선이었다니 반골의 제주섬이 작아 보인다는 선입감보다 아주 어마어마한 큰 섬으로 다가온다.
그렇게 갇혀진 제주에서 환상의 섬처럼 나타나는 간출여는 숨통 트이게 하는 별세계인지 모른다.
유년시절 이러한 간출여에서 날물일 때는 소라 등을 마구잡이로 너나할 것 없이 어떠한 제약도 없이 캐었던 적이 아련한 그리움처럼 떠오른다.
닐모리동동(내일 모레 등으로 간절하게 기다리는 마음의 제주어)의 마음으로 해녀들이 간출여를 기다리고 있지만, ‘출륙금지령’이라는 위리안치 속의 간출여는 가출여(家出女)로서 2백년 박해에 대한 항거의 상징으로 클로즈업되었다.
다음은 ‘섬, 신구간’이다.
섬, 신구간 新舊間
신神인들 별수 있나 먹고는 살아야지
대한과 소한 사이, 이레 혹은 여드렛쯤
저마다 일자리 찾아 섬을 비운
만팔천 신
그 틈새 놓칠세라
사람들은 사람들대로
눈치 볼 일 하나 없이 이삿짐을 꾸린다
섰다판 끗발 안 나면 서로 자리 바꾸듯
이번엔 어떤 신이 또 나를 간섭할까
이왕에 만날거면
청춘 한때 목련 같은
그 허기 그 세월이면 동티나도 좋아라
섰다판 끗발 안 나서 서로 자리바꿈처럼 신구간을 이용해서 잽싸게 이사를 한다. 오승철 시인의 시에는 섰다판이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그때마다 공통점이 있다. 해학과 풍자를 마치 연날리기처럼 자유자재로 구사한다는 점이다.
이번 작품에는 엄숙한 제주 신구간의 풍습 관례를 비아냥거리고 있다. 정말 동티날 일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지만 해학과 풍자로 그것을 희석시키고 민중의 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서귀포’이다.
서귀포
사람보다 서귀포가 그리울 때가 있다
“오 시인, 섶섬바당 노을이 뒈싸졈져”
노 시인 그 한 마디에 한라산을 넘는다
약속은 안했지만, 으레 가는 그 노래방
김 폴폴 돼지 내장
두어 접시 따라 들면
젓가락 장단 없어도 어깨 먼저 들썩인다
‘말 죽은 밭’에 들어간 까마귀 각각 대듯
한 곡 더 한 곡만 더
막버스 놓쳤는데
서귀포 칠십리 밤이 귤빛으로 익는다
시조집 이름이 ‘사람보다 서귀포가 그리울 때가 있다’가 들어 있는 시이다. 섶섬과 서귀포 칠십리 밤이 귤빛으로 익는다가 아니면 ‘서귀포 그리울 때’는 한 군데도 없다. 그런데 읽노라면 서귀포가 아니라 서귀포 밤이 그리워지고 있다. 김 폴폴 돼지 내장이나 노래방은 한라산을 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있다.
막버스 놓쳐버린 서귀포 칠십리 밤이 귤빛으로 익는다에 가서 서귀포가 그리울 때로 뒈싸져버렸다.
오승철 시인은 서귀포 위미리 출신으로 1981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겨울귤밭’으로 등단. 시조집 <오키나와의 화살표> <터무니 있다> <누구라 종일 홀리나> <개닦이> 등을 펴냈다.
중앙시조대상, 오늘의 시조문학상, 한국시조대상, 고산문학상 대상 등을 수상했고, ‘오늘의 시조시인회의’ 의장을 역임했다.